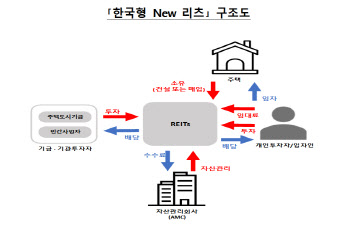올해 가계대출시장의 대표적 특징을 꼽으라면 ‘무력화’라고 답하는 시장 참여자가 상당수다. 당국의 입김에 맞춰 은행권이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면서 시중금리를 결정하는 요소인 기준금리, 신용점수, 담보물의 가치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는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금리 왜곡을 불러왔다는 업계와 시장 참여자들의 시각이다.
|
한국은행은 지난 1월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지만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는 오르지 않았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변동 금리는 1월 첫째 주(2일)만 해도 연 5.27~8.12%로 상단이 8%를 넘겼지만,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된 지 일주일 뒤엔 연 4.60~7.02%(20일 기준)로 오히려 떨어졌다. 통상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도 올라야 하지만 되레 떨어진 것이다. 한은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올렸으나, 금감원의 개입으로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내리는 바람에 긴축정책 효과가 반감된 셈이다. 즉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갉아먹는다는 뜻이다.
당시에도 금융권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대출 금리 인하를 압박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임원 회의(1월 10일)에서 “금리 상승기에 은행이 시장 금리 수준, 차주 신용도 등에 비춰 대출 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은행의 금리 산정·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일부 은행은 이후 가산금리 인하에 나섰다.
당국의 말 한마디면 은행들이 가산금리, 우대금리 등을 조절하면서 담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 보다 신용대출 금리가 더 낮아지거나, 저신용자보다 고신용자의 대출금리가 더 오르는 등의 비정상적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금리 가격 결정 주체는 1990년대에 정부에서 시장으로 바뀌었지만, 금융권 안팎에서 “금리 가격이 시장 매커니즘보다 정부 규제 영향을 더 받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당국도, 은행들도 ‘갈팡질팡’
‘대출 부담 완화’와 ‘가계 빚 억제’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금융당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당국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소상공인이) 은행 종노릇’ 발언 이후 금융권에 상생금융을 압박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갑질·횡포’라는 비판과 ‘가계빚 주범’이라는 낙인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상생금융 압박에 대출 금리는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커 주담대를 받으려던 서민들이 대기모드로 돌아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다만 작년에도 정부는 서민을 위한다며 예금 금리를 올리라고 했다가 반 년도 되지 않아 은행에 예금이 쏠린다며 금리 인하를 주문하는 등 갈지(之)자 행보를 한 바 있다.
주주가 있는 민간 회사를 압박하는 식으로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의 과도한 개입과 오락가락하는 방침에 은행 뿐 아니라 금융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포토]제시 린가드, 'VIP 시사회 출전'](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500161t.jpg)
![[포토]서울시,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추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501121t.jpg)
![[포토]화재진압 훈련하는 종로구 소방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501083t.jpg)
![[포토]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최종 브리핑](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501019t.jpg)
![[포토]평생당원 초청 간담회 참석하는 한동훈 당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500858t.jpg)
![[포토] 세계최초 8K 온디바이스 AI TV](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500697t.jpg)
![[포토]추경호,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해야...투명한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500657t.jpg)
![[포토]패딩이 필요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500647t.jpg)
![[포토]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500637t.jpg)
![[포토] 훈련장 이동하는 '시니어 아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401152t.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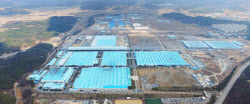
![[포토] 롯데 챔피언십 공식 포토콜 단체사진](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500107t.jpg)